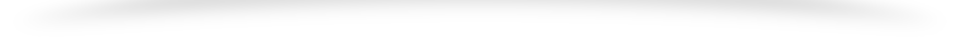그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으로 태어난다.” 1926년경 미국에서 부착된 우생학 옹호 포스터.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2018년 한국은 여러 이슈로 시끄러웠습니다. 정리된 사안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갈 길이 먼 것도 남아 있지요. 남녀 갈등이 대표적일 텐데요. 그 전선(戰線)은 여러 국면에 펼쳐져 있습니다. 예컨대 임신중절과 관련된 갈등은 그 골이 깊지요. 임신중절 자체도 여러 면으로 따져볼 내용이 많지만, 특히 임신중절에 관한 법은 세세히 뜯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성(母性,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을 말합니다)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겠다는 온정주의적 목적을 띤 모자보건법이 바로 임신중절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14조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적으로 혼인할 수 없는 가족 또는 친척 사이, 여성이 임신으로 인해 건강상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큰 거부감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항목에 이상한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에게 질병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유전학적 이유는 충분히 그럴 법하지만, 아니 “우생학적” 사유라니요.

모자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우생학”
우생학(優生學, Eugenics), 즉 ‘잘 낳는 것’에 대한 학문이라는 이 표현은 통계학자이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인류학자, 탐험가에 지리학자, 발명가, 기상학자인 프랜시스 골턴 경(Sir Francis Galton, 1822~1911)이 1883년 발표한 『인간 능력과 그 계발에 관한 탐구(Inquiries into Human Faculty and Its Development)』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골턴은 책에서 우생학이란 “신중한 짝짓기를 통해 가축을 개량하는 과학이며, 이는 인간에게도 적용”되는 학문으로, “더 적절한 인종이나 핏줄에게 빨리 퍼질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힙니다.[1] 흔히 비슷한 시기에 허버트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가 주장했다고 알려진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과 자주 혼동되고는 합니다. 스펜서가 주장한 사회진화론은 자유방임주의 경제 체제가 사회에 가장 잘 적응한 자를 남기기 때문에 사회를 진보시키는데 보다 적절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반면 골턴의 주장은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탄생할 것이라는 생각을 생물학적 관점에서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진화생물학을 크게 두 요소, 즉 유전과 자연선택으로 나눌 수 있다면 사회진화론은 자연선택, 우생학은 유전에 초점을 둔 사상이었다는 점에서 그 궤가 다르지요.

그림. 골턴은 여러 분야에서 왕성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특히 제자 칼 피어슨(Karl Pearson, 1856~1936)과 함께 통계학에서 불후의 업적을 남겼다. 1850년대에 촬영된 골턴의 모습.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진화생물학을 만든 찰스 다윈(Charles Darwin, 1809~1882)의 사촌이기도 했던 골턴은 워낙 여러 분야에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다양한 영역에서 그의 이름을 접하게 됩니다. 더구나 그 업적 하나하나가 해당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골턴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유산을 상속받은 후에는 의사 일을 접고 탐험 길에 올랐습니다.[2] 기상학에서 고기압(anticyclone)을, 통계학에서 회귀(回歸, regression)와 상관(correlation)을, 심리학에서 차이 심리학(differential psychology)과 단어연상검사를 만들어내고, 법의학에서 지문을 법적 증거로 만든 사람이 모두 같은 사람이라면 믿어지시겠어요.[3] 하지만 이 모두가 골턴이 남긴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공을 들였던 연구 분야가 바로 우생학이지요.
특징은 평균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골턴은 1859년 발표된 『종의 기원』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2] 또한 그 자신이 의사로 교육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탐험가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생긴 인류학적 관심을 정량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것일 수도 있지요. 그는 이후 유전에 관해 연구하기 위해 가계도(pedigree)와 신체 계측(biometrics)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유전에 관한 1869년 저작인 『유전적 천재(Hereditary Genius)』에선 이름난 집안들을 조사했고, 1885년 영국 과학진흥협회 인류학 분과 연설 발표에선 부모와 자녀의 키 분포를 살폈어요. 1889년에 발간된 『자연적 유전(Natural Inheritance)』에서는 키에 나타난 특징을 예술적 능력이나 결핵에 걸릴 경향 등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골턴은 통계학을 다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분위수(quartile), 백분율(percentile),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개념에 이름을 붙여준 사람이 골턴이니까요. 중앙값(median, 변량(variable)을 크기 순서로 정렬했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값) 을 대푯값으로 사용했던 것도 그입니다.[4]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회귀, 더 정확히는 평균으로의 회귀(regression to the mean)를 발견한 것도 골턴입니다.
그가 처음에 복귀유전(reversion)이라고 부른 회귀는 1875년 스위트피(sweet pea)를 가지고 한 실험에서 경험적으로 증명됩니다. 그는 씨앗들을 무게에 따라 7개의 집단으로 나누고 자가교배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각 자손 집단의 평균 무게는 달랐는데, 하나같이 정규분포 (평균을 중심으로 종 모양을 한 확률분포를 )를 보였고 그 퍼진 정도가 같았습니다. 특이한 점은 자손 집단의 평균 무게는 부모 씨앗의 평균 무게가 아니라 자손 집단 전체의 평균 무게에 보다 가까웠다는 점입니다.[2] 이렇게 자손의 씨앗 무게가 자손 전체의 평균 무게로 돌아가려는 경향을 보이며, 씨앗 무게가 세대를 거듭해도 퍼지지 않고 전체 집단의 평균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발견에 골턴은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발견은 부모와 자녀의 키 분포를 연구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는 928명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의 키를 조사합니다. 이를 교차표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골턴은 기하학적 특징을 발견합니다. 그가 표현한 바에 따르면, “같은 값을 가진 항목을 연결하면 중심이 같은 타원 여러 개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5] 현대 통계학 용어로는 “일정한 빈도가 이루는 동심 타원을 알아냈으며 두 개의 회귀선을 찾아”낸 것이죠.[2] 그는 부모 키와 자녀 키의 중앙값을 도표로 그려 자녀 키가 나타내는 편차가 부모 키 편차의 2/3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자녀 집단의 사람들 사이의 키 차이가 부모 집단의 키 차이보다 작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키에서도 평균으로의 회귀를 확인한 것입니다. 논문에서 골턴은 이런 현상이 부모 이전의 조상으로부터 온 유전적 영향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우리 조상은 다양한 키를 가지고 있었고 그 영향이 자녀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골턴은 이후 연구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계속 씨름합니다.[3]


그림. 평균으로의 회귀를 다룬 최근 논문[4]은 골턴 자료를 보면서 빠지기 쉬운 착각을 지적한다. 부모로부터 자녀로 이행할 때에(위 그림)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그렇다면 자녀로부터 부모로 갈 때는 어떨까? 반대로 평균에서 멀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위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녀에서 부모로 갈 때도(우측 그림)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난다. 평균으로의 회귀는 유전적 현상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측정을 두 번 하는 경우 두 측정 중 한 번이 극단 값이라면 다른 한 번은 보다 평균에 가까운 값이 나온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통계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인과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회귀 오류(regression fallacy)”라고 부른다. 파란 점은 측정치, 점선은 45도선, 적색 선은 회귀선이며 표시 방법은 논문[4]을 따랐다. 시각화는 필자
골턴이 내놓은 해석이 틀렸다는 것은 이제는 다들 아는 상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전자가 대대로 내려오긴 하지만, 당장 제 키를 결정하는 것은 제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체 두 쌍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골턴이 그저 실수를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의 일부만 드러낼 뿐입니다. 골턴은 여기에서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고 이를 일반화했습니다. 평균으로의 회귀라는 현상은 유전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 현상은 다양한 요인에 인해 최종 결과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만들어진 현상입니다.
어느 한 교실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상당히 어려운 쪽지 시험을 봅니다.[6] 100명 학생의 점수는 다양하게 나타날테죠. 이때 최상위 10명과 최하위 10명을 모아 다시 시험을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최상위 10명의 점수 평균은 내려가고 최하위 10명의 평균은 올라갑니다. 즉 평균으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최상위 10명은 첫 시험에서 성적을 잘 받아 기고만장해 공부를 안 했고, 최하위 10명은 성적에 충격을 받아 공부를 더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쪽지 시험이 어려운 경우,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력도 있지만 운도 중요합니다. 첫 시험에서 최상위 10명은 기본 실력도 좋았겠지만, 당일 운도 따랐을 겁니다. 최하위 10명은 반대겠지요. 아마도 실력은 며칠 사이에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험에서 이들의 운은 첫 시험과 같지 않습니다. 최상위 10명의 평균 점수는 떨어질테고, 최하위 10명은 운이 계속 나쁘지는 않을 테니 그들의 점수 평균은 올라갈 겁니다.
골턴이 측정했던 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키는 다양한 유전자가 영향을 미치고 이에 환경적 영향이 더해져 그 표현형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부모의 키가 큰 경우 아이는 부모 키를 크게 만든 여러 유전자 중 몇 개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게다가 환경적 조건도 다릅니다. 부모 키를 크게 만들었던 유전적, 환경적 영향이 아이 대에서는 다르게 나타날 테니까요. 평균에서 벗어났게 했던 “특이” 요인들이니 아이 대에서 더 적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물론 부모 키가 크면 아이 키가 클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하지만 키가 큰 부모를 모아 놓는다면, 그들 자녀의 키 평균은 당연히 부모 키 평균보다 작겠지요. 키가 큰 부모라고 무조건 큰 키를 가진 아이‘만’ 낳는 것은 아니니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평균으로의 회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골턴은 인간에서 특성이 발현되는 것을 모두 유전으로 해석하려 했습니다. 그는 20세기 내내 회자되었던 “자연 대 양육(nature versus nurture)”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개체의 특성 발현에 대해 환경의 영향은 최소화하고 대신 유전적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유전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Stephen Jay Gould, 1941~2002)는 『인간에 대한 오해』에서 골턴과 당대 우생학자들이 제기한 이런 생각을 “유전자 결정주의(genetic determinism)”라고 부르며 신랄하게 비판합니다.[7] 굴드의 말처럼 유전자 결정주의는 우생학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과 결합하며 열성인자의 제거를 위한 강제 불임 시술과 안락사라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생학이라는 악령
우생학은 크게 두 가지, 적극적 우생학(positive eugenics)과 소극적 우생학(negative eugenics)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적 우생학이란 “뛰어난” 남녀가 결혼하도록 장려하고 이들이 더 많은 자손을 남겨 “좋은” 유전자가 더 많아지도록 한다는 접근을 의미합니다. 소극적 우생학이란 사회적, 의학적 개입을 통해 “모자란” 남녀가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을 말합니다. 20세기 초에 두 정책이 모두 시행되었고 그 중 여전히 악의 대명사로 남아있는 것은 나치 독일입니다.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1889~1945)는 게르만족이 가장 우월한 민족이라고 주장한 한스 귄터(Hans F. K. Günther, 1891~1968)와 그의 책 『독일 민족의 인종 과학(Rassenkunde des deustschen Volkes)』을 따라 아리안족을 이은 게르만족 혈통이 가장 우수하며, 따라서 이들이 세계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8] 히틀러와 나치 독일은 게르만족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 우생학과 소극적 우생학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우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신체 조건 등을 토대로 선별한 남녀가 결혼하도록 주선하고, 이들이 자녀를 갖도록 장려했습니다. 또한 1933년 통과시킨 “유전병을 지닌 자녀 예방법”에 의거해 조현병, 간질, 헌팅턴 무도병 등 유전된다고 알려진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강제 불임시술을 시행합니다. 이는 이후 장애인 안락사 정책인 “T4 작전(Aktion T4)”으로 이어져 약 30만 명이 이로 인해 사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 나치 우생학 선전 포스터. “유전적 결함을 앓고 있는 이 사람에게 사회는 평생 60,000라이히스마르크(나치 시절 독일 통화, 1924년 당시 독일 화폐의 교환 가치는 4.2라이히스마르크가 1미국달러였다고 한다)를 들인다. 동포여, 그것은 당신의 돈이기도 하다.”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나치 독일이 패망한 후 이를 주도한 칼 브란트(Karl Brandt, 1904~1948) 등 의사 20명과 관료 3명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기소됩니다. 인체 실험과 안락사를 가장한 대량 학살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이었지요.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렸고 기소당한 이들이 모두 의사였기에 “의사 재판(Doctor’s Trial)”으로 불린 이 재판에서 기소당한 나치 의사들은 미국 의사들 또한 자신들과 같은 행동을 했다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 예로 제시되었던 것 중 하나가 ‘벅 대 벨(Buck v. Bell) 판결’입니다.
콜드 스프링 하버 연구소의 우생학 기록 사무실(Eugenics Record Office)에서 일하던 해리 러플린(Harry Laughlin, 1880~1943)은 우생학을 근거로 지적 장애인에 대한 강제 불임시술을 시행하는 법을 설계하고, 1924년에 몇 개 주가 이 법을 도입합니다. 이 법을 근거로 1924년 한 의사가 당시 18세이던 캐리 벅에 대한 불임시술을 허용해달라는 청원을 주정부에 넣습니다. 새로 도입한 우생학 법을 시험해보려던 목적이었죠. 그는 벅의 정신 연령이 9세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그 어머니 또한 정신 연령이 9세인데다, 매춘과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기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벅은 임신했는데 이는 벅이 “구제 불능”이라는 증거라고 그 의사는 말했습니다(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벅을 입양한 가정의 친척이 벅을 강간했고, 내쫓길 것을 두려워한 벅은 이런 사실을 밝힐 수 없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벅과 그 어머니가 “의지박약”과 “난잡함”을 보이므로 국가가 불임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립니다.[9] 이 판결은 미국 대법원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 중 하나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요.[10]
나치 의사들이 제기한 이런 사례를 그저 무시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결국 “의사 재판”은 단순히 나치 의사를 단죄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뉘른베르크 강령(Nuremberg Code)”이라는 인간 대상 연구 윤리 원칙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뉘른베르크 강령은 국제 사회가 채택한 최초의 생명 윤리 원칙이라는 의의도 있지만, 제1 강령에서 대상이 자발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향후 생명 윤리 논의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한 규약이라는 점에서도 무척 중요합니다.
우생학적 접근은 나치 독일이 벌인 가장 끔찍한 악행 중 하나가 되었고, 의과학이 남긴 어두운 역사로 아직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우생학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어가 되었고, 우생학은 유사과학으로 남았죠.
여기서 하나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우생학 자체가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우생학에서 받아들일 만한 부분도 있는 걸까요? 혹시 유전자 결정주의만 뺀다면 우생학은 괜찮지 않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우생학 속에서 산다
유전자 결정주의, 즉 유전자가 한 인간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요인이라는 주장은 인간의 발달과정에 미치는 다양한 환경적 영향이 밝혀지고, 또한 환경이 유전형 발현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후성유전학(epigenetics)의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이제는 예전만큼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산모가 임신했는데, 태아에게 유전 질환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산모가 임신 중절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유전학적 이유라고는 하나, 그 결정은 우생학적입니다. 태어날 아이가 “좋은 삶”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산모의 선택은 잘못일까요,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섣불리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문제가 품고 있는 결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은 부모에게, 사회에게, 태어날 아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사회 수준에선 장애인에 관한 양육 부담을 짊어질 수 없다는 입장과 장애인까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부딪힐 것 같고요. 부모 수준에선 막중한 양육 부담을 감내토록 할 수 없다는 입장과 사회가 이를 받아줄 준비가 안 된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개별적인 인간이 존재할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것 또한 문제라는 입장이 서로 화해하지 못할 겁니다. 아이를 두고선 태어난 후 살게 될 ‘나쁜’ 삶을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과 그 삶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 역시 이미 또 하나의 편견이라는 입장이 제시될 수 있겠지요. 이 모두는 한데 섞여 있지만, 살펴볼 때는 거칠게라도 나눠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사회적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나치는 장애인을 안락사시키거나 그들에게 강제 불임 수술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로 사회가 지게될 부담을 제시했습니다. 소위 공리주의적 태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런 견해는 상당히 보편적입니다. 사람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가에 관한 기준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세금을 낼 수는 없다는 것은 모두의 공통적인 바람이니, 사회가 제공할 수 있는 보건과 복지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장애인 수를 줄이는 것이라면, 이미 태어난 사람을 문제 삼을 수는 없더라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 태어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면 그건 괜찮을 거라고 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편이 전제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속한 성원이 살아갈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기본적인 편익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으로 태어났을 때 기본적인 활동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더 큰 불편을 겪어야 하는 사회는 그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아이에게 사회가 기본적인 편익마저 제시하지 못해 그 존재를 부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사회는 기본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며, 따라서 장애인을 임신했다고 고민하게 만드는 사회가 잘못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부모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에게 너무 큰 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공리주의가 주장하는 바와 비슷할 수 있지만, 공리주의적 논의가 주로 경제적 차원을 중심으로 한다면 부모 관점에서 볼 땐 이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돌봄 노동을 누가 할 것이냐 부터 시작해, 아이를 어떻게 돌볼 것인가, 어디에서 돌볼 것인가, 돌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할 것인가와 같은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이가 겪을 어려움은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부모의 삶이 큰 어려움에 부닥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그냥 견뎌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잘못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요.
한편 어떤 사람이 자신과 독립적인 한 인간의 존재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생명권 중시라고 분류할 이 논의에 관해, 이전에는 신이 내린 명령이라는 논거로 정당화했다면 이제는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으로 논의가 나아가고 있지요. 그 삶이 좋을지 나쁠지를 묻는 것은 이미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일입니다. 만약 삶이 끔찍하다는 생각에 부모가 중절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아이가 내릴 선택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요. 물론 이런 주장에는 무리가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 선택권을 부여받지 않은 태아에게 부모가 대리 선택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등 잘못된 일이 아닌데, 굳이 문제로 삼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가 내린 선택이 최선일 것이라고 마냥 가정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이나 학대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사라질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아이 입장에서도 두 가지 입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살아갈 삶이 너무 끔찍하다고 여겨 부모가 장애를 가진 아이를 중절한다는 선택은 아이가 누릴 것을 어떻게 재단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유불리를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과거 객관적인 쾌/불쾌를 기준으로 했다면 최근에는 주관적 웰빙(well-being)이나 개인 선호를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과연 장애 아동이 보낼 삶은 마냥 끔찍하기만 한 것일까요? 그 삶은 “나쁜” 것일까요? 만약 아이가 누릴 삶이 나쁘다면 중절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선택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그 삶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면 중절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이런 여러 입장을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위 질문은 질문자와 답변자를 심란하게 만듭니다. 아마 우생학이나 유전자 조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의는 이와 비슷한 다양한 논란의 층위를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가정, 개인을 다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 따라서 누가 휙하고 답을 던질 수는 없고 사안마다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겠지요. 여기에 고려할 점 하나만 얹고 이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바로 우생학적 선택과 유전자 조작 결정은 차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차별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철학적으로 많이 논의된 주제는 아닙니다. 정치철학자인 카스퍼 리퍼트–라스무센(Kasper Lippert-Rasmussen)이 2014년에 출간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Born Free and Equal?)』 는 이 차별 개념을 깊게 파고든 노작입니다.[11] 리퍼트-라스무센이 보기에 차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 차별”입니다. 개인이 지닌 어떤 특성 때문에 누군가에게 다른 대접을 받는 것은 포괄적으로 차별에 속하지만, 이를 문제 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신체적 특징을 이유에 넣는 것은 넓은 범위에서 차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특징을 지닌 사람들을 집단으로 묶을 때, 그리고 이들을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과 다르게 대할 때, 그리고 그런 대우 때문에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악화할 때 차별은 문제가 됩니다.

그림. 1938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촬영된 사진. 당시 미국은 “평등하지만 분리한다(separate but equal)”는 정책을 통해 인종차별을 유지했다. 이후 시민운동과 입법을 통해 분리 정책은 사라졌지만, 차별은 여전히 남아있다. 차별하기는 쉽지만, 차별을 없애기는 어렵다. 새로운 차별을 만들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는 이유다.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우생학은 어떨까요? 앞서 살핀 것처럼 골턴은 족보나 키, 지능 검사 등을 통해 단지 생물학적 특징이 어떻게 유전되는가를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생물학적 특징이 사람들에게 정규분포 형태로 나타나지만, 선택적으로 이뤄진 결합에서 탄생한 자녀 집단은 그 생물학적 특징이 정규분포 형태를 띠고 있더라도 그 평균은 상향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훌륭한”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자식들은 평균적으로 더 뛰어난 생물학적 특징을 지닐 것이고, 이런 현상이 세대에 걸쳐 누적되면 뛰어난 인종적 집단이 생겨날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최근 유전자 조작이 그리는 미래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생학과 유전자 조작은 인구 사이에 구분 선을 긋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우생학이나 유전자 조작을 통해 자녀가 정상 범위 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 정도라면, 이는 반대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환경이 인간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을 법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우생학이나 유전자 조작을 통해 교육과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오히려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일수도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우생학이나 유전자 조작이 개인 능력을 향상하는 쪽으로 이용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눈 색깔을 아이에게 준다면 그건 어떨까요? 아마 눈동자의 색깔 자체는 아이의 능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눈 색깔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 조작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이 나눠질 때 우리는 그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피부색이 그랬고 머리카락 모양이 그랬으며 심지어 성별 또한 그렇죠. “사람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라고 인권 선언이 나왔던 것은, 이것이 서로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역사의 가르침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우생학적으로 사고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 서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아니, 곧 닥칠 미래일까요?). 하지만 누군가(특히 장애인의 경우) “책임지지 못할 임신을 했다”고 숙덕거릴 때, 자녀가 들고 온 성적표를 빌미로 배우자의 “머리”를 탓할 때, 외국인과의 결혼을 비난하고 다문화 가정 아이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때, 우리는 여전히 우생학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조작을 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완벽이 왜 잘못인가? (What’s wrong with perfection?)”라고 묻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생각 깊숙이 뿌리내려 있는 차별을, 그 밑바닥을 보여줍니다. 유전자와 관련하여 여러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한 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생학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등은 피로 쟁취한 모두의 권리라는 것을, 차별을 없애기 위해선 오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참고문헌
[1] Galton F. Inquiries into Human Faculty and Its Development. London, England: Macmillan and Co. 1883. pp. 24-25.
[2] 스티븐 스티글러, 조재근 옮김, 『통계학의 역사』, 한길사, 2002, “영국에서의 혁신적인 발달: 골턴”.
[3] Gillham NW. A Life of Sir Francis Galt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4] Senn S. Francis Galton and Regression to the Mean. Significance. 2011;8(3):124-126.
[5] Galton F. Regression towards Mediocrity in Hereditary Stature. The Journal of the Anthropological Institute of Greate Britain and Ireland. 1886;15:264-263. pp. 254-255.
[6] Wikipedia contributors. Regression toward the Mean.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Feb 3, 2019. <https://en.wikipedia.org/wiki/Regression_toward_the_mean>
[7] 스티븐 제이 굴드, 김동광 옮김, 『인간에 대한 오해』, 사회평론, 2003.
[8] Cornwell J. Hitler’s Scientists: Science, War, and the Devil’s Pact. New York: Viking. 2003.
[9] 274 U.S. 205
[10] Cook M. Buck v Bell, One of the Supreme Court’s Worst Mistakes. BioEdge. Feb 15, 2019. <https://www.bioedge.org/pointedremarks/view/buck-v-bell-one-of-the-supreme-courts-worst-mistakes/11779/>
[11] Lippert-Rasmussen K. Born Free and Equa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14.
글 깎는 의사
Latest posts by 글 깎는 의사 (see all)
- 길먼 대 미첼, 휴식 치료는 여성 혐오일까? - May 14,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