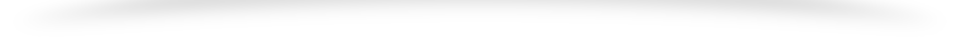1993년 8월 《뉴욕 타임스 선데이 매거진》은 모델의 사진 하나를 내보내기로 합니다. 예술학교를 졸업하고 1975년부터 이탈리아와 프랑스, 미국의 뉴욕에서 유명 예술가들과 함께 작업한 사진의 주인공에게, 저명한 여성복 디자이너 찰스 제임스는 “미래의 모델(The Model of the Future)”이라는 찬사를 바쳤으니, 그의 사진이 나가는 것을 두고 뉴욕 타임스의 결정이 특이한 일이었다고 언급하는 것이 오히려 신선하게 느껴질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진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크나큰 파문을 불러오게 될 것이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촬영한 그의 초상 사진에는 자신의 가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니, 드러나 있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더 적절할까요. 1991년 유방암 진단을 받은 모델 마투쉬카(Matuschka, 1954~ )는 오른쪽 유방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1993년 마투쉬카의 초상은 있어야 할 것 대신 남은 흉터를 대중에게 드러내고 있었지요.

<손상 바깥의 아름다움(Beauty Out of Damage)> (1993) 출처: 위키미디어
환부(患部, 병이나 상처의 자리)를 드러내기 위해 절개한 하얀 원피스와 머리에 둘둘 감아 길게 내려뜨린 하얀 실크 숄은 전신을 감은 붕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그의 얼굴 때문에 귀에서부터 내려오는 목 빗근* 이 빗장뼈의 비스듬한 각도와 더해 화살표처럼 프레임의 중앙을 가리키고 있네요. 마주할 눈이 없기에,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진 가운데로 향한 눈은 빛과 그림자의 좌우 대조 때문에 그 경계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한가운데에 위치한 손상의 흔적을 주목할 수밖에 없도록 짜여 있는 사진.
*sternocleidomastoid muscle, 앞가슴뼈 위, 빗장뼈안에서 시작하여 귀 뒤쪽까지 뻗은 목의 긴 근육
그곳에는 여성의 상징이라고 하는 유방이 제거된 흔적이 드러나 있습니다. 도드라지는 것은 그 아래 갈비뼈의 윤곽―성경은 최초의 남자에서 갈비뼈를 취해 최초의 여자를 만들기 위한 기초로 삼았다 했으니, 그것은 단순히 뼈가 아니라 기원의 상징입니다―이며 수술 후에 남은 절개의 흉터입니다. 사진을 찍고 게재한 이유 중 가장 극명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것이겠죠. 기존의 미(美) 이데올로기에 대한 도전.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이 가득히 느껴지는 사진은 사진을 보는 이에게, 또 세상에 도전합니다.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가슴, 그 부재의 상태에서도 나는 아름다울 수 있다고요. 당신의 잣대로 나를 재단하지 말 것. 그야말로 최근에 회자하는 탈코르셋의 전형입니다.
유방 절제술(mastectomy)은 한쪽 또는 양쪽의 가슴을 외과적으로 제거하는 시술을 말하는데, 보통 유방암 치료를 위해 시행됩니다. 유방암의 경우 림프 조직을 따라 암세포가 쉽게 전이되어 재발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방을 완전히 제거하는 편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겨드랑이 쪽에서 접근해 들어가 조직을 제거하게 되므로 시술 후에는 가로로 흉터가 남게 됩니다. 국내에선 매년 약 5,000여 건의 유방절제술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니, 드문 수술은 아니네요. 유방 절제술의 역사는 생각보다 깁니다. 예컨대 영국 작가 패니 버니(Fanny Burney)가 쓴 최초의 여성 투병기 《유방 절제술》(1812)은 마취나 적절한 수술 기법*이 없던 19세기초에 얼굴을 가린 채 맨정신으로 수술을 견뎌야 했던 환자 자신의 고통을 생생하게 묘사한 작품으로 남아 있습니다.
*1894년 미국의 전설적 외과의 할스테드(Halsted)가 근치 유방절제술(radical mastectomy, 유방, 흉근, 겨드랑이의 림프절, 피부, 피하조직 모두를 절제하는 수술법)을 개발하기 전까지 절제 수술은 해당 부위를 무턱대고 잘라내거나 소작(燒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절제술을 받는 것으로 사태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공중목욕탕이나 수영장에 가는 것이 꺼려지며 적극적인 신체 활동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상실했으며(66.8%), 장애인이 되었다고 느낀다고(62.0%) 답했습니다. 수술로 신체 활동에 불편감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 유방 절제술로 잘라내 지는 것이 단순히 신체 조직만이 아니라는 의미겠지요. 가슴을 잘라낸 칼은 여성성 또한 잘라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환자들이 보형물을 착용하던가 아니면 유방 재건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술을 받았다고 드러내고 다니는것은 흉하니,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가려야 한다고요. 그 탓이었을까요. 마투쉬카의 사진이 《뉴욕 타임스》에 실리자 비난의 목소리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마투쉬카의사진을 다룬 한 논문에 의하면, 다른 인기 있거나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을 때보다 4배에 가까운 전화가―비난이―사무실로 걸려 왔다고 합니다).
왜 가슴 부위에 남은 흉터를 드러낸 사진이 눈길을 끌까요? 몸에 가로로 새겨진 수술의 흔적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기호학자는 여기에서 여성의 신체를 둘러싼 신화를, 그리고 여성과 모성의 이데올로기를 볼 것입니다. 구조주의 언어학자는 이곳에서 모성으로 시작하여 모자[어머니와 아들(母子)이지만 머리에 쓰는 물건(帽子)이기도 한]를 거쳐 모유[어미의 젖(母乳)이자 원대한 꾀(謀猷)]로 이어지는 환유와 은유의 운동을 감지하겠네요. 라캉 학파 정신분석가는 이곳에서 결여를, 그리고 아무리 채우려고 애를 써보지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과녁을 읽어낼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론을 통해 사진을 해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으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 사진은 불편할까요? 왜 마투쉬카의 모습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찍이 영화비평가 로라 멀비가 논문 “시각적 즐거움과 서사적 영화(Visual Pleasure and Narrative Cinema)”에서 규정한 남성적 응시(male gaze)를 통해 매체에 등장한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쾌락을 충족하는 관음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 사진이 가져오는 불편함에 대하여
철학자이자 비평가인 수전 손택은 자신의 저서 《타인의 고통》을 프랑스 시인 보들레르(1821~1867)와 영국 시인 테니슨(1908~1892)의 구절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보들레르가 “… 정복당한 자들을!”이라고 외치자 테니슨이 “체험이라는 추잡한 보모…”라고 받는 것이죠. 원래 충격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찍었던 사진이 매체에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원래의 의도를 상실하고, 대신 그 안에 그려진 고통을 남의 것으로(“타인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손택의 주장을 따라 두 구절을 생각해 볼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정복당해 사진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관조하고 있는 관람객이 혹시라도 인물이 처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더라도, 어떤 장치가 우리를 다시 편안한 삶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반탄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겠죠. ‘아, 아프겠다. 하지만 난 이곳, 안전한 내 안식처에 있으니까, 난 괜찮아.’ 사진작가가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대상의 고통을 전달하려고 찍은 사진은 오히려 지금 이곳에 있는 나의 편안함을, 안전함을, 고통 없음의 상태를 대비하여 비춰 주는 거울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어떤 매체를 열어 고통의 사진을 보아도 그것은 나의 ‘보모’입니다. 그것을 누군가는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 : schaden(상처) + freude(기쁨) )라고 했습니다. 남의 고통을 통해 느끼는 나의 기쁨.
마투쉬카의 사진이 여전히 마음속에 걸린다면, 위의 분석은 어울리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아니, 전쟁 사진을 보고 열변을 토한 손택의 말은 마투쉬카의 사진 앞에서 허우적거리죠. 그 안에는 고통이 없습니다. 사진 속 그의 당당한 표정이, 그의 존엄함이 보이시는지요. 그 당당함은 자신의 고통을 전시해 상대방의 연민을 끌어내고자 함이 아닙니다. 고통이 없으니 샤덴프로이데라는 말도 적절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나를 괴롭힙니다. 그것은 어쩌면 비유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질병과 증상의 전시는 신체적 반응을 일으키니까 말입니다. 영화에서 누군가 심한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는 장면이 나올 때 코가 간질간질해진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또는 감염성 질환의 공포를 그린 영화를 보면서 몸이 괜히 으슬으슬해지거나 약을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지않은가요? 고어 영화(gore movie, 유혈이 낭자하고 신체가 훼손되는장면이 자주 등장하는 공포영화)를 보면서 배가, 팔이 시큰거린 적은 없었는지요.
다른 사람의 신체에 가해진 손상은 내신체의 유기적 통일성에 위협을 가합니다. 그것은 내 몸에 새겨진 고통의 기억을 불러일으키죠. 프랑스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1871~1922)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초반에서 화자는 침대에 누워 떠오르는 생각들을 늘어놓습니다. “지나치게 잔 나머지 옴짝달싹 못 하는 나의 육신은 그 피로의 정도에 따라서 사지의 위치의 표점을 정하고 나서, 벽의 방향과 세간의 자리를 추정하고, 몸이 누워 있는 방을 다시 구성해 이름 붙인다. 육신의 기억, 갈빗대에, 무릎에, 어깨에 남아 있는 기억이, 지난날 육신이 누웠던 여러 개의 방을 잇따라 그려 보여 준다.”[3] 타인의 신체에 가해진 훼손을 보는 일은 몸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여 우리를 붙잡습니다. 우리가 명시적으로 떠올리지 못하는 지점을 기억하고 있는 몸은 그 아픔에 반응합니다. 오히려 전쟁의 파국과 그 참상을 그린 사진이 손택의 말처럼 구경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은 현대인이 그런 경험을 해본 일이 없음을 방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 넘어져 무릎이 까진 일은 분명 있으실 거예요. 잠깐 사이에 종이에 베인 손 때문에 씻는 내내 불편한일은 자주 일어나지요. 그렇게 몸에 차곡차곡 쌓인 다쳤던 기억들을 다시 불러내는 것은 남의 신체에 남은 상처 자국입니다.
시선의 윤리
그 불편함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요. 예컨대 시선의 윤리라고 하는 것을 상정할 수 있을까요. 보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눈을 감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어불성설이라면, 시선의 윤리라는 것은 무엇을 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볼것인가를 가름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지요. ‘쳐다보지 말아야지.’ 내 앞을 지나가는 나와 다른 누군가가 있을때 우리는 흘낏 정도만 보는 것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믿습니다. 상대방은 그 조건이 생득적이든 아니든간에 이미 여러 번 이런 시선을 받았을 것이고, 남과 다르다는 것으로 계속 눈초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오랫동안 불편하게 느껴왔을 테니까요. 따라서 쳐다보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혹시라도 눈에 들어왔다면 겸연쩍게 슬그머니 눈을 돌려주는 것이 우리가 교양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교양은 남에게 권장해야 할 일, 따라서 우리는 다른 외형을 지난 사람을 신기하게 쳐다보는 아이에게 가르칩니다. “너무 쳐다보지 마.” 아이로 인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고스란히 들여다보이는 배려입니다. 문제는, 이 배려가 불편함과 더해질 때 발생합니다. 그순간, 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만드는 그 모습에, “쳐다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이죠. 쳐다보면 안 되는 사진을 공공에 전시한다면, 그것은 전시하는 사람의 잘못입니다. 마투쉬카의 사진을 싣겠다는 뉴욕 타임스의 결정이 논란을 일으켰던 것은 그 때문일 것 같아요. 그의 모습이 드러내는 것은 우리가 보지 말아야 할 것, 보았다고 해도 금방 눈을 돌려야 하는것이 아니었는지요. 따라서 그 사진은 공공에 전시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가리는 것이 그를 위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고 있으면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쳐다보지 마세요”가 아닌 “나를 보세요”라고 말하는 속삭임이. 마투쉬카의 사진은 속삭이고 있습니다. 2003년 《뉴욕 타임스 매거진》 커버 스토리에 등장한 장애인 인권 변호사이자 작가로 그 자신이 퇴행성 신경근육질환(degenerative neuromuscular disease)으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닌 해리엇 맥브라이드 존슨(Harriet McBryde Johnson, 1957~2008)의 사진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심각한 장애가 있는 태아를 탄생 과정에서 안락사시키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저명한 윤리학자 피터 싱어에 반대한 존슨. 그는 <나는 태어날 때 죽어야 했나요? (Should I have been killed at birth?)>라는 제목의 초상 사진을 뉴욕 타임스 표지에 실었습니다.

Katy Grannan for The New York Times
Harriet McBryde Johnson asks, should I have been killed at birth? In “Unspeakable Conversations,” she presents the case for her life
자신의 머리를 받칠 힘이 없어 잔뜩 수그린 자세로 얼굴을 치켜들고 있는, 왜소하지만 아름다운 그의 모습은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꼭 연민의 대상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요.
정상과 건강의 편에는 항상 편안함, 안정, 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은 내 몸으로 사는 일은 얼마나 행복한지요. 탄탄한 근육을 드러낸 모습에서, 최신 유행의 옷을 입고 자세를 취한 모습에서 우린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반대편을 보는것은 어떻습니까? 그 모습이 나에게 초래하는 불편은 어떤 반응으로 이어지는지요. 나의 불편함을 상대방의 안녕으로 치환하여, 상대방을 도움받아야 할 대상으로 격하시킬 때가 있는것 같습니다. 도와줄 테니 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을 테니 우리가 준 도움으로 만족하라고요. 물론 마투쉬카의 사진이 당시 유방암 운동의 상징이 되었을 때, 사진은 그런 사회의 구속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하지만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마투쉬카의 사진, “폐허가 된 여성의 신체”는 다른 방식으로 읽혀야 할 때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진은 운동의 색채를 벗고 슬그머니 머릿속으로 들어와 속삭입니다. 지금 느끼는 불편함을 부정하지 말아요, 당신은 상처 입었고, 상처 입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상처의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애써 지우려 애씁니다. 하지만 온전함이란 환상 같은 것, 오히려 수많은 상처를 깁고 디뎌 여기까지 온 것이 삶 아니었는지요. 손택이 말한 ‘타인의 고통’ 대신, ‘나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시선의 윤리가 다시 출발하는 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참고문헌
[1] 정일용, 강은영, 양은주 등. 유방절제술을 받은 유방암환자가 경험하는 사회심리적 문제 및 유방재건술에 대한 인식 조사. Journal of Breast Cancer. 2011;14(S):S70-76.
[2] Rosolowski TA. Woman as Ruin. American Literary History. 2000;13(3):544-577.
[3] 마르셀 프루스트, 김창석 옮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스완네 집 쪽으로》, 파주: 국일미디어, 1998, 11쪽.
[4] Garland-Thomson R. Chapter 15. Beholding. Davis LJ ed. The Disability Studies Reader 3rd Ed. NY: Routledge. 2010. pp. 199-208.
글 깎는 의사
Latest posts by 글 깎는 의사 (see all)
- 길먼 대 미첼, 휴식 치료는 여성 혐오일까? - May 14, 2019